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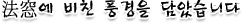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미쳐야 미친다
2010.02.16 13:41
"•••• 잊는다(忘)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해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지, 출세에 보탬이 될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냥 무조건 좋아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는 말이다. 붓글씨나 그림, 노래 같은 기예도 이렇듯 미쳐야만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미쳐야 할 것인가?"
(정민 著, 미쳐야 미친다, 푸른 역사, 2004, 30쪽에서)
무슨 일이든 거기에 몰두하여 푹 빠지지 않는다면 이루기가 어렵다. 미치지 않고 어찌 도달하겠는가(不狂不及)! 미쳐야 미치는 것이다.
높푸른 하늘과 단풍으로 물든 山河가 유혹하는 것을 외면한 채 침침한 눈을 부벼가며 컴퓨터 앞에서 晩秋의 주말을 보내다가 문득 '이 무슨 미친 짓인가?'하고 홀로 썩은 미소를 지은 적이 있었다.
겨울의 초입을 눈 앞에 둔 늦가을의 을씨년스런 일요일, 여자중학교 교실에서 '저 아저씨는 여기 왜 왔지?'하는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는 10대 소년소녀들 틈에 끼어 텝스(TEPS)를 보며 '이 무슨 미친 짓인가?'하는 생각을 했었다.
20대 후반이나 기껏해야 30대 초반의 한창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근시용과 노안용의 안경을 바꿔 써가며 論資試를 보느라 땀을 흘린 적이 있다. 그 때도 '이 무슨 미친 짓인가?'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미쳐서(狂) "住宅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라는 글을 썼건만, 다시 보니 정작 미치지(及)를 못했다. 얼마를 더 미쳐야 제대로 미칠 것인가?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더 미치기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너무 깊다.
오호라, 늦여름의 밤이 소리없이 깊어가고 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70 | 퇴임사(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4] | 범의거사 | 2012.07.11 | 14704 |
| 169 | 강정마을 해군기지 | 범의거사 | 2012.07.06 | 11641 |
| 168 |
기우제
| 범의거사 | 2012.06.24 | 14626 |
| 167 |
나물 담고 설거지하고(퍼온 글)
| 범의거사 | 2012.06.24 | 13443 |
| 166 |
이웃나라인가 먼 나라인가
[2] | 범의거사 | 2012.05.28 | 14120 |
| 165 |
땅끝의 봄
| 범의거사 | 2012.05.09 | 22012 |
| 164 |
달리 부를 이름이 없다
| 범의거사 | 2012.04.24 | 15083 |
| 163 |
춘분날 아침에
| 범의거사 | 2012.03.22 | 14768 |
| 162 | 2012년 신임법관 임용식사(대법원장) | 범의거사 | 2012.02.28 | 11496 |
| 161 |
흑룡의 해에 쓰는 입춘방
| 범의거사 | 2012.01.30 | 106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