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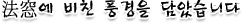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삼분지족(三分之足)
2021.11.20 23:20
한 달 전인 10월 중순에 느닷없이 밀어닥친 추위로 겨울이 일찍 오나 했는데,
정작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져 만추(晩秋)의 즐거움을 만끽했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2주 전에 입동(立冬)이 지나고 이틀 후면 소설(小雪)인데도 말이다.
오늘 50년 지기 죽마고우 백동, 담허와 함께 예봉산(해발 683m)을 올랐다.
지난 8월에 두타산 무릉계곡을 다녀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함께 산행을 한 것이다.
포근한 날씨가 산행하기에는 적격이었는데, 그만 실종된 하늘이 보태주질 않았다.


[올림픽대로에서 본 하늘의 모습]
이른 아침에 팔당대교를 향해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본 하늘색은,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죽음의 회색빛이었다. 그 아래서 숨을 쉬고 사는 게 용하다고 할 만큼 끔찍하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개인이건 국가건 이웃도 이웃 나름이다.
지금부터 벌써 이러면 올겨울을 어찌 날거나.
2008년 봄에 한 번 오른 적이 있던 예봉산은 ‘강우레이다관측소’가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에 들어선 것을 빼고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주위 풍광은, 하늘을 덮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근의 운길산도 아니고 발아래의 한강도 아닌 온통 수묵 담채화(水墨 淡彩畵)였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강우레이다관측소]
 [예봉산 정상]
[예봉산 정상]

[정상에서 본 수묵 담채화 풍경]
잿빛 하늘을 제외하고는 예봉산은 의구(依舊)하건만, 13년 만에 그 산을 찾은 나그네의 마음은 예전만 못하다.
그동안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르며 감정이 서서히 메말라간 데다,
열흘 전에 죽마고우 구암(龜岩)을 영원히 떠나보낸 아쉬움에 더하여 회색빛 하늘이 겹친 까닭이다.
산에서 내려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벗의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5년 전 신체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괴질이 발병하여 내내 고생하다 결국 세상과 작별을 고한 친구는 남양주의 양지바른 선영에 잠들어 있었다.
이승에서는 좋아하는 소주를 원없이 마시면서 고통 없는 삶을 살라고 빌고 또 빌었다.

지공선사(地空禪師)의 반열에 들어선 후로도 늙어감을 애써 외면하고 지냈는데,
작금에 친구나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새삼 나이를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친구의 부친상이나 모친상에 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본인상(喪)이나 그의 배우자상(喪)에 문상을 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발버둥친다고 세월의 흐름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그보다는 그에 순응하며 사는 게 현명하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인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남긴 ‘낙치설(落齒說)’이라는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전략)...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종 말을 타기도 한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져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곤 했다.....(중략).....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 추한 꼴이 드러났다....(중략)....
주자(朱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볼 때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고, 경전 외우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니 마음을 살필 수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중략)...
대저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긴다.”
김창흡이 나이 66세 때(1718년) 앞니가 쑥 빠진 후 쓴 글이다.
300년 전의 66세가 지금의 66세일 리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대저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긴다(蓋忘老者妄, 嘆老者卑, 不妄不卑, 其惟安老乎)”
는 말이 폐부를 찌른다.
100세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은 65세 전후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주장하고,
UN에서도 평생연령기준을 재정립하여, 65세까지를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으로 정의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나이 들어감을 거부하는 몸부림일 뿐이다.
목하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취임 1년도 안 되어 재선을 생각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79세,
이미 종신집권의 길을 가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69세,
앞으로의 종신집권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68세
라고 하지만,
예로부터 정치인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를 기준으로 할 일은 아니다. 어쩌면 노정객(老政客)들에 드리운 노탐(老貪)의 그림자가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제먼지 가득한 하늘의 석양과 보름달]
흔히들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과연 그럴까.
오늘 하늘이 아무리 잿빛이어서 저녁에 지는 해나 밤이 되어 그 자리를 대체한 보름달마저 뿌옇게 보일지라도, 미세먼지가 걷히고 나면 그 해, 그 달은 다시 본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사람의 흘러간 세월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호사가들의 부질없는 숫자놀음으로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분수를 알고(知分) 분수를 지키고(守分) 분수에 만족(安分)할 일이다.
그것이 노추(老醜)를 면하는 길이리라.
댓글 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30 | 인간답게 죽을 권리 | 범의거사 | 2010.02.16 | 17990 |
| 329 | 민일영 교수님 | 김동현 | 2010.02.16 | 17936 |
| 328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재판연구관 | 2010.02.16 | 17869 |
| 327 | 집게 든 판사님 | 범의거사 | 2011.01.05 | 17730 |
| 326 | 둘이 서로 꼭 붙들고 [3] | 범의거사 | 2010.02.16 | 17701 |
| 325 | 각자에게 그의 몫을! | 범의거사 | 2010.02.16 | 17648 |
| 324 |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2] | 범의거사 | 2010.02.16 | 17506 |
| 323 | 불법도청된 내용의 공개와 언론의 자유 [1] | 범의거사 | 2011.03.24 | 17483 |
| 322 | 흐르는 강물처럼 | 범의거사 | 2011.12.30 | 17467 |
| 321 |
입동의 풍요
[1] | 범의거사 | 2011.11.08 | 17366 |










지금부터라도 문필가로 데뷔해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