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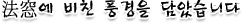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해마다 해는 가고 끝없이 가고(年年年去無窮去)
2020.12.27 10:40
동지(冬至)도 지나고,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경자년(庚子年)의 마지막 주말이다.
예전 같으면 시끌벅적할 연말이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디를 가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실로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감염병이다.
올 1년 내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랴.
다행히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어 한 시름 놓을 듯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백신을 구입한 나라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조차도 백신을 구입했건만,
K-방역을 자랑하느라 자만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는 아직 기약이 없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언젠가는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안 할 테니 말이다.
일찍이 교과서를 통해 최치원(崔致遠)이 토(討)황소격문(본래 명칭은 檄黃巢書<격황소서>)을 지었다(881년)는 말만 들었는데, 근자에 그 전문(全文)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세에 순응하여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름으로써 패망한다.
비록 우리의 백 년 인생이 하늘의 명에 달려있어, 죽고 사는 것을 기약할 수는 없으나,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옳고 그른 것은 가히 분별할 일이다.
(智者成之於順時 愚者敗之於逆理 然則雖百年繫命 生死難期 而萬事主心 是非可辨)
또 다른 대목을 보자.
“회오리바람은 하루아침을 가지 못하고, 소낙비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늘의 일도 이처럼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일이랴.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天地尙不能久 而況於人乎)
하늘이 악한 사람을 잠시 도와주는 것은 그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행이 쌓이게 하여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天之假助不善 非祚之也 厚其凶惡而降之罰)
최치원이 이 격문을 지은 후 1,000년 넘게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읽을수록 참으로 소름이 돋는 경구(警句)이다.
코로나19 말고 또 경자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윤(尹)·추(秋) 전쟁(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호가호위(狐假虎威)하던 추미애 장관의 완패 형국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뜨거운 감자에 내려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징계나 집행정지의 당부를 떠나,
소위 ‘사법농단’을 징치(懲治)한다며 법원을 들쑤셔 놓은 장본인이 정작 그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셈이 된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정녕 모를 일이다.
집행정지결정이 묘하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내려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호사가들의 한낱 우스개 소리일 뿐이다.
김삿갓의 싯귀대로 ‘시시비비시시비’(是是非非是是非.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시비이다)이런가.
알지도 못하는 세상사의 이치를 알려고 골치를 썩이느니,
언제나 말없이 촌부를 반겨 주는 금당천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 백배 낫다.
저물어 가는 경자년을 상징하듯,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해가 연출하는 저녁노을이 황홀하기만 하다.
하늘의 해와 물속의 해는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이런 이런, 또 시비를 가리려고 하네.
부설거사(浮雪居士)가 진즉에 ‘분별시비도방하’(分別是非都放下. 분별과 시비를 다 놓아버려라)를 설파하였거늘, 고질병은 어쩔 수가 없다.


마침 물가에 있던 해오라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른다.
추운 겨울이 왔건만 어째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예서 머무는 것일까.
동료들 떠날 때 무리 지어 함께 갈 것이지 홀로 남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든다.

어쩌면 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금슬 좋기로 유명한 캐나다 거위는 짝이 먼저 죽으면 그 주변을 맴돌다 죽는다고 하던데.
금당천의 저 백로도 그런 건가.
홀연히 세상을 등진 님을 못 잊어 남아 있는 걸까,
아무튼 백로 한 마리가 홀로 남은 사연은 알 길이 없는데,
여울을 차고 오르는 날갯짓이 왠지 처연하기만 하다.
반백(半白)의 노부(老夫)가 느끼는 공연한 심사인가.
조선 중기의 무신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을 이곳으로 불러내 본다.
人方憑水檻(인방빙수함)
一鷺飛沙灘(일로비사탄)
白髮雖相似(백발수상사)
吾閒鷺未閒(오한로미한)
촌부가 물가의 정자에 기대 있노라니
백로 하나 여울에서 날아오른다.
나나 너나 똑같은 백발이다만
나는 한가로운데 너는 그렇지 못하구나.
***원문은 2행이 ‘鷺亦入沙灘’(노역입사탄. 백로 또한 여울로 내려선다)이다.
혹시 저 해오라기의 날갯짓이 가는 해를 아쉬워하는 몸짓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내 일러주리라.
아서라, 해가 진다고 아쉬워할 일이 전혀 아니란다.
오늘 진 해가 내일 떠오르고,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온단다.
그래서 그 옛날 김삿갓이 노래하지 않았더냐.
年年年去無窮去(연년년거무궁거)
日日日來不盡來(일일일래부진래)
年去日來來又去(연거일래래우거)
天時人事此中催(천시인사차중최)
해마다 해는 가고 끝없이 가고
나날이 날은 가고 쉼 없이 오네.
해가 가고 날이 오고, 오고 또 가는데
밤낮으로 사람 일만 그 속에서 바쁘구나.
해가 가고 달이 가도 새날은 끊임없이 온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을 가는 나그네가 바로 뭇 중생이다.
그러니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 일이다. 그게 순리다.
이를 거스르려 하니 괜스레 부산스럽고 바쁘다.
더구나 실속도 없고,
자칫 패가망신하기까지 한다.
앞서 본 최치원의 글 첫머리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세에 순응하여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름으로써 패망한다.
(智者成之於順時 愚者敗之於逆理)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10 |
술에 취하면 깨면 되지만
[2] | 우민거사 | 2021.12.26 | 264 |
| 309 |
종로 원각사, 민일영 전 대법관과 '점퍼 나눔' (퍼온 글)
| 우민거사 | 2021.12.17 | 64 |
| 308 |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퍼온 글)
| 우민거사 | 2021.12.17 | 73 |
| 307 |
삼분지족(三分之足)
[4] | 우민거사 | 2021.11.20 | 256 |
| 306 |
풍재지중이십분(楓在枝中已十分)
[6] | 우민거사 | 2021.10.30 | 247 |
| 305 |
검으면 희다 하고 희면 검다 하네
[4] | 우민거사 | 2021.10.03 | 249 |
| 304 |
백로(白露)와 백로(白鷺)
| 우민거사 | 2021.09.05 | 134 |
| 303 |
항민(恒民),원민(怨民),호민(豪民)
[3] | 우민거사 | 2021.08.08 | 299 |
| 302 |
구름은 바람이 푼다(風之解雲)
[4] | 우민거사 | 2021.07.18 | 272 |
| 301 |
미라가 된 염치
[2] | 우민거사 | 2021.06.27 | 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