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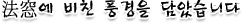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한 해를 보내며(次古韻)
2014.12.31 10:15
2014년의 마지막 날이다.
정말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이 가고
푸른 양의 을미년이 다가오고 있다.
갑오년의 해나 을미년의 해나 다 똑같은 해일 뿐 다른 해일 리가 없지만,
그래도 내년이면 32년간 몸답았던 법원을 떠나는 범부에게는
새해가 열리는 느낌이 다르기만 하다.
마침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을 구구절절이 피부에 와 닿게 그려낸 詩가 있어
필부의 심정을 그 시에 담아 한 해를 마무리한다.
꽃 피는 새 봄이 오면 붕우(朋友)와 함께 술동이를 비워볼까.
한 해를 보내며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
골짜기로 가는 긴 뱀처럼
서둘러 해가 넘어가는 때라
눈앞으로 지나가는 세월을 보며
오랫동안 상념에 젖어 있다.
나이 든 얼굴은 움츠러들어
귀밑머리엔 서리가 내려앉고
추위가 기세등등한 가운데
나뭇가지엔 눈이 얹혀 있다.
글 읽는 사람으로
스스로 힘써야 할 뿐
청산 밖 세상사를
어찌 알겠는가?
아름다운 약속을 남겨
술동이를 가득 채워 놓고
꽃을 피우는 첫 번째 바람이 불
그날을 기다리노라.
次古韻
赴壑脩鱗日不遲 (부학수린일부지)
年光閱眼久尋思 (연광열안구심사)
衰容縮瑟霜添鬢 (쇠용축슬상첨빈)
寒意憑凌雪在枝 (한의빙릉설재지)
黃卷中人須自勉 (황권중인수자면)
靑山外事也何知 (청산외사야하지)
十分盞酒留佳約 (십분잔주유가약)
會待花風第一吹 (회대화풍제일취)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 선생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에 쓴 시이다.
세밑에는 잊고 지냈던 세월의 흐름이 의식 속에 들어오고,
나이와 건강과 해놓은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즐겁고 아름다운 상념에 젖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마는
대개는 주름살 깊어진 얼굴처럼 아쉬움과 한탄이 앞서기 마련이다.
성호 같은 철인(哲人)도 청산 밖 세상일은 모른다고 했다.
남이나 세상일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는 필부로서는 자기 자신에게나 집중할 밖에.
꽃피는 봄에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여유를 찾을 수 있으려나.
그 때 쯤에는 술동이의 술도 잘 익으리라.
하여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60 |
창 밖에 해가 느리게 가고 있구나(窓外日遲遲)
| 우민거사 | 2018.05.27 | 471 |
| 259 |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 우민거사 | 2018.04.22 | 8285 |
| 258 |
아무리 얼우려 한들
| 우민거사 | 2018.03.26 | 7509 |
| 257 |
손가락 끝에 봄바람 부니 하늘의 뜻을 알겠다
| 우민거사 | 2018.02.24 | 8102 |
| 256 | 변화하는 세상 섭리 그려낼 자 뉘 있으랴 | 우민거사 | 2018.01.22 | 7680 |
| 255 | 비바람이 얼마나 불까 | 우민거사 | 2017.12.26 | 9802 |
| 254 |
有色聲香味觸法(유색성향미촉법)
| 우민거사 | 2017.11.26 | 10310 |
| 253 |
보고도 말 아니 하니
| 우민거사 | 2017.11.04 | 9955 |
| 252 |
방하심(放下心)
| 우민거사 | 2017.09.26 | 10189 |
| 251 |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 우민거사 | 2017.09.25 | 8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