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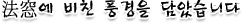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물 같이 바람 같이
2020.11.30 22:20
1주일 전(11월 22일)이 소설(小雪)이었고, 1주일 후(12월 7일)면 대설(大雪)이다. 비록 눈 소식은 없지만, 정녕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선 것이다.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낮에도 수은주가 영하에 머물고 있다.
가을은 이제 저만치 물러갔다.
그 가을이 못내 아쉬워 ‘삽살이’를 데리고 금당천 들녘으로 나섰다.
삽살이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말썽이가 데리고 가는 바람에 경산의 한국삽살개재단에서 새로 구해 온 삽살개다. 삽살개는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우리나라 토종개인데, ‘삽살개’라는 이름은 귀신이나 액운을 쫓는 뜻을 지닌 ‘삽(쫓는다, 들어내다)+살(귀신, 액운)+개’의 합성어로, 순수 우리말이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듯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이지만, 그래도 금당천변에는 아직 가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냇가의 갈대도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추수가 끝나 텅 빈 논은 또 다른 황금색을 띠고 있어 정감이 간다. 그 정경을 필설로 그리려니 촌부의 빈약한 재주로는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일찍이 고려 후기의 문인 함승경(咸承慶)이 읊었던 가락을 흉내 내 본다.
黃昏日將沒(황혼일장몰)
雲霞光陸離(운하광육리)
江山更奇絶(강산갱기절)
老子不能詩(노자불능시)
황혼에 해가 지려 하니
구름과 노을에 눈이 부시네
강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늙은이 재주로는 시를 짓지 못한다
[원문은 제1행이 ‘淸曉日將出(청효일장출: 맑은 새벽에 해가 뜨려 하니)’이다.]
금당천에는 촌부가 시를 짓지 못한다고 해서 흉볼 사람이 없다.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거닐며 정경을 눈과 가슴에 담을 뿐이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면 된다. 그런다고 관람료를 낼 일도 없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의 청산은 촌부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靑山見我無語居), 창공은 촌부더러 티 없이 살라고 한다(蒼空視吾無埃生).
그렇다. 그게 자연이 가르치는 순리이다.
유한(有限)한 인생이니,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면(水如風居歸天命) 된다. 그렇지 않고 탐욕과 성냄으로 점철되는 나날을 보내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 종국에는 커다란 화를 입게 되고, 그게 업보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된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목하 벌어지고 있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준의 이전투구(泥田鬪狗) 현장에 대고 ‘탐욕과 성냄’을 벗어 놓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이독경(牛耳讀經)이려나. 순리를 벗어난 종착역은 필시 이이제이(以夷制夷)와 토사구팽(兎死狗烹)일진대, 그것이 한낱 무지렁이 촌부의 눈에만 보이는 걸까.
옛 시조 한 수를 읊조리며 삽사리와 집으로 돌아가는 금당천변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 어둠의 끝은 새벽이겠지.
묻노라 부나비야 네 뜻을 내 몰라라
한 마리 죽은 후에 또 한 마리 따라오니
아모리 푸새엣 것인들 네 죽을 줄 모르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0 |
본디 책을 읽지 않았거늘(劉項元來不讀書)
[2] | 우민거사 | 2021.05.23 | 203 |
| 299 |
한 모금 표주박의 물(一瓢之水)
[4] | 우민거사 | 2021.05.09 | 317 |
| 298 |
한 잔 먹세 그녀
[1] | 우민거사 | 2021.04.25 | 220 |
| 297 |
세상에는 찬 서리도 있다
| 우민거사 | 2021.04.03 | 211 |
| 296 |
조고각하(照顧脚下)
| 우민거사 | 2021.03.21 | 200 |
| 295 |
아니 벌써
| 우민거사 | 2021.03.03 | 145 |
| 294 |
과부와 고아
| 우민거사 | 2021.02.14 | 141 |
| 293 |
오두막에 바람이 스며들고(破屋凄風入)
| 우민거사 | 2021.01.09 | 265 |
| 292 |
해마다 해는 가고 끝없이 가고(年年年去無窮去)
| 우민거사 | 2020.12.27 | 275 |
| » |
물 같이 바람 같이
| 우민거사 | 2020.11.30 | 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