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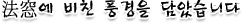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앗, 벌써 2월이~
2024.02.04 11:06
오늘이 입춘(立春)이다.
1년 24절기의 첫 시작으로 봄이 옴을 알리는 날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3.7도였고, 한낮 최고 기온은 영상 12.2도이다(금당천은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1도)..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51년 동안 서울의 입춘일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두 번(2014년과 2018년)이나 있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넘은 것은 기상관측 첫해인 1973년(11.4도) 이래 51년 만에 있는 일로, 영상 12.2도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다. 실로 따뜻한 입춘이 된 셈이다.
불과 열흘 남짓 전인 1월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체감온도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8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벼락치듯 다가온 봄에 실로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그런 입춘의 이른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깨 문을 열고 나서자, 금당천의 눈이 다 녹아 물결이 넘실댄다. 포은(圃隱) 선생의 표현대로 雪盡南溪漲(설진남계창. 눈 녹은 남쪽 개울에 물이 넘쳐난다)이다.

입춘이 되어 동장군(冬將軍)이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니 반갑기는 한데, 입춘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새 2월이라는 의미도 지니니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아니 벌써~”이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2월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 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벙글 웃고 있는 꽃.
외출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외투를 벗는 2월.
그래서 시인의 말대로 뜰 안의 매화 가지를 살펴 보았지만 아직 봄의 기별이 없다. 그런데 매화 대신 목련이 촌노의 눈을 크게 뜨게 한다. 꽃망울이 맺힌 것이다.

이럴 때 꿩 대신 닭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꿩 대신 봉황이라고 해야 하나. 닭이라고 하자니 목련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고, 봉황이라고 하자니 이건 너무 추켜세우는 것 같다.
매화는 그냥 매화이고 목련은 그저 목련일 따름이니, 비교 자체가 허튼짓이다. 세상 만물은 무릇 있는 그 자체로 볼 일이지, 말하기 좋다 하고 함부로 언설(言說)을 농(弄)할 일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실제와는 달리 억울하게도 매우 사치스럽고 부패한 사람의 상징으로 몰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투아네트를 어느 정치 입문 초년생이 신중하지 못하게 입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다(촌노가 당부를 논할 일은 아니지만, 그는 이 일로 끝내 국회의원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
바야흐로 총선이 65일밖에 안 남은 정치의 계절이니 정치인들의 말의 성찬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지만, 그럴수록 조심할 게 또한 말이다.
예로부터 病從口入 禍從口出(병종구입 화종구출)이라고 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병이 나게 하고, 입을 잘못 놀려 말을 함부로 하면 곧 몸을 망치는 화를 불러오는 법이다.
그러니 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어느 옛 시인이 이런 시(詩)까지 남겼을까.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물론 그렇다고 위 시인처럼 아예 입을 다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물며 말로써 먹고사는 정치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할 말과 못 할 말을 가려서 할 일이다. 그러지 않고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든 오로지 표만 얻으려는 욕심에 백성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다면, 그는 이미 정치인이 아니라 정상배(政商輩)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 옥석을 가려 위정자(爲政者)와 위정자(僞政者)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은 온전하게 국민의 몫이다.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금당천을 따라 발길을 옮기는 사이에 동녘 하늘이 밝아온다.
“아니 벌써 2월이~”의 자리에 “아니 벌써 아침 해가~”를 놓아본다. 그렇게 “아니 벌써~”를 몇 번 되뇌다 보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가고, 촌노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더 내리리라.

댓글 6
-
안창회
2024.02.04 11:33
말씀대로 봄이 성큼 와 버린 느낌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문한 합천은 훨씬 아래여서 더욱 실감 했습니다. 벽화를 둘러보며 12월 그 추운날 작업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봄 기운을 느끼다니... 벌써 봄이 왔음보다 세월의 빠른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
우민거사
2024.02.04 12:13
화살 같이 흐르는 세월입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김텃골
2024.02.04 20:18
악! 소리 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언제 또 일케 그 해박한 지식에 더해 지난 날씨 정보까지 기억해 후딱 글을 쓰셨는지..
내공이 정말 대단하세여.
일필휘지란 말은 붓글씨 쓸 때나 쓰는 말인줄 알았드만
우민거사님 께서 붓을 들든, 펜을 들든,
자판을 두들기든 다 일필휘지로군요..
사부작 사부작
시부적 시부적 끍적이면 곧 한편의 시고 수필이니..
한국 수필 문학사에 빛나는 .
우민 거사님 인생의 입춘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합니다. -
우민거사
2024.02.05 10:51
나날이 노쇠의 길을 걷는 촌노에게는
1년에 고작 한 번뿐인 입춘보다는
인생의 입동이 훨 자주 찾아오는구먼유~ ㅠ
-
Daisy
2024.02.05 09:30
어제가 입춘이었다니 세월가는 줄 모르고 지냈군요.
이러다 눈깜짝할 사이에 입동까지…
시간이 너무 빨라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청춘!!! -
우민거사
2024.02.05 10:53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청춘이시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41 |
푸른 4월과 잔인한 5월
[6] | 우민거사 | 2024.04.30 | 141 |
| 340 |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4] | 우민거사 | 2024.03.23 | 153 |
| 339 |
금당산인(金堂散人)
[8] | 우민거사 | 2024.02.17 | 160 |
| » |
앗, 벌써 2월이~
[6] | 우민거사 | 2024.02.04 | 127 |
| 337 |
헛된 소망인가?
[4] | 우민거사 | 2024.01.06 | 136 |
| 336 |
사립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4] | 우민거사 | 2023.12.16 | 118 |
| 335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사 | 우민거사 | 2023.12.15 | 56 |
| 334 |
일말의 가능성
[8] | 우민거사 | 2023.11.25 | 177 |
| 333 |
'법의 창'을 통해 바라본 두 세상
[2] | 우민거사 | 2023.10.30 | 41 |
| 332 |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꺾어 들고
[2] | 우민거사 | 2023.10.29 | 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