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은 달마에 걸리고(미황사, 달마산)
2011.11.04 10:22
달은 달마에 걸리고
가을이 깊어간다.
그 깊어가는 가을에 맞추어 산천의 색이 변해 가면서 유혹의 손길을 보내온다. 외면하고 지낼 거냐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멀리 한반도의 땅끝으로.
2011. 10. 15. 토요일이다.
10시 55분발 목포행 KTX에 몸을 실었다. 물 흐르듯 역사를 빠져 나가는 이 고속열차는 올해 들어 유난히도 잦은 고장에 구설에 올랐다. 하필이면 브라질, 미국 등 해외로 수출길을 뚫으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단련이 되면 단단해지는 걸까, 목포까지 가는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주행시간 3시간 30분의 시간표도 정확히 지켰다. 더욱 갈고 닦고 조여서 세계 시장에 자랑스럽게 진출하길 바랄 뿐이다. 절차탁마 대기만성(切磋琢磨 大器晩成)이라고 하지 않던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황금빛 들판은 풍요롭기만 한데, 기차 안에서 주문받아 주는 도시락은 냉기만 흐른다. 제조시각을 보니 아침 7시다. 그걸 따뜻한 국물도 없이 먹으라는 건 예의가 아니다. 새마을호처럼 식당칸을 운영하면 안 될까. KTX가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기차 안에서 밥 때를 보내야 하는 장거리손님은 늘 있게 마련인데...
영암에서 F1 대회가 열려 목포시내는 렌트카가 동이 났지만, 미리 예약한 덕분에 차를 빌릴 수 있었다. 그 차를 타고 진도의 운림산방(雲林山房)으로 향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뒤의 첨찰산(尖察山, 485m)을 배경으로 하여 연못(가로 33m, 세로 27m. 가운데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다)을 파고 집을 지었는데, 주위 풍광이 자연스레 아늑하면서도 넉넉하게 조화를 이룬다.
뒤의 첨찰산(尖察山, 485m)을 배경으로 하여 연못(가로 33m, 세로 27m. 가운데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다)을 파고 집을 지었는데, 주위 풍광이 자연스레 아늑하면서도 넉넉하게 조화를 이룬다.
안내를 맡은 이평기씨의 구수하고도 해학이 넘치는 해설을 들으며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대를 이어가는 허씨 가문(소치 허련의 3남이 미산 허형이고, 손자가 남농 허건이다)의 예술혼이 여기 저기 스며 있다.
소치의 화상을 모신 운림사(雲林祠)에는 소치의 화상 옆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새긴 목판이 걸려 있다. 추사는 소치에게 문인화를 가르친 스승이다. 그 스승의 영정을 나란히 거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대신 당신의 대표작인 세한도를 새긴 목판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70여 점을 전시한 기념관에서는 소치와 그 후손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 그림들을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한양에서 천리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다.
진도에서 나와 진도대교를 건너 해남으로 가는 길에 울돌목에서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내려섰다.  가까이에서 보는 물살의 빠르기라니, 깊은 산 계곡의 물살도 이만 못하지 싶다. 도대체 바닷물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물살이 워낙 빠르다 보니 그 흐르는 소리가 울부짖는 듯하여 울돌목(鳴梁)이라는 지명이 생겼으리라.
가까이에서 보는 물살의 빠르기라니, 깊은 산 계곡의 물살도 이만 못하지 싶다. 도대체 바닷물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물살이 워낙 빠르다 보니 그 흐르는 소리가 울부짖는 듯하여 울돌목(鳴梁)이라는 지명이 생겼으리라.
이곳으로 안내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의 허의천과장 왈, 여기서 빠지면 제주도 앞바다에서나 시체를 건질 수 있다고 한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두신 님의 전술에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남의 천일식당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붐빈다. 바야흐로 중추(仲秋)의 청명한 주말인데다 영암의 F1 경기를 보러 온 손님들까지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유홍준이 그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한정식을 제대로 하는 3대 음식점 중 하나라고 칭찬한 이 음식점은 유명한 떡갈비 외에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갖가지 향토음식을 내놓는다. 배만 부르지 않고 시간만 넉넉하다면 밤새도록 앉아 한없이 먹을 판이다.
밤 8시 30분, 마침내 미황사에 도착했다. 사위가 깜깜하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산사에 이렇게 늦게 찾아온 것이 분명 예의에 어긋난 일이지만, 사무장과 주지스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사머물기’(템플스테이)를 처음 시작한 절답게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따뜻하고 정갈한 요사채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절 뒤 달마산에 걸린 반달이 넋을 놓게 한다. 수줍은 듯 구름 속에 숨었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그 달을 바라보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는데, 최유정 판사가 그 달이 걸린 달마산이 정말로 달마대사의 형상이라고 감탄한다. 듣고 다시 보니 그럴싸하다.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도 다른 모양이다.
맑은 하늘이라 많은 별들이 떠 있건만, 달이 밝으니 그 별빛이 흐리다. 그 하늘에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면 조조가 적벽대전을 앞두고 읊은 단가행(短歌行)에 나오는 그대로 “월명성희 오작남비(月明星希 烏鵲南飛)”이다. 그런데 까마귀 대신 상해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날아가니 뭐라고 해야 하나...
깊은 산속이라 한기를 느끼고 주지 금강스님의 방으로 옮겨 풍경소리를 들으며 다담삼매경(茶談三昧境)에 빠져들었다. 스님이 비장의 무기로 내놓으신 보이차의 맛이 실로 오묘하기 짝이 없다. 이 차를 마시니 이제껏 마셔본 보이차는 다 가짜 같다. 그 깊고 달면서도 그윽한 향기를 어찌 필설로 다 말할까. 참으로 행복에 겨운 밤이다.
차를 다 마시고나자 스님이 쓰신 책을 한권 주신다. 미황사의 365일을 담담히 기록한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이라는 책이다. 그 책의 첫 장에 “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라는 임제선사의 글을 쓰고 낙관을 찍어 주신다. 그게 범부에게 가능한 일일까. 일단 화두로 삼아 볼 일이다.
2011. 11. 16. 일요일이다.
새벽예불을 알리는 도량석에 눈을 떴다. 새벽 4시이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법당에 가니 벌써 만원이다. 산사머물기(템플스테이)를 하는 선남선녀들로 가득하다. 앞 사람의 엉덩이에 부딪혀 절하기도 힘들다. 그동안 여러 곳의 절에 가서 새벽예불에 참여하여 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산사머물기(템플스테이)의 성수기(?)인 여름에는 많게는 200명 정도 참여하고, 보통 때도 80명 내지 10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한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니 중생들도 마음을 다스릴 일이 많으리라.
예불 후 법당 앞의 마당에 서니 아직도 달이 훤하다. 여명이 다가옴인가 간밤보다 달마산의 형상이 더욱 또렷하다.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는 아침공양을 마치고 주지스님을 따라 절을 둘러보았다. 가람의 건물과 공터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어디 하나 허튼 공간이 없다. 그래서 너무 숨을 곳이 없어 수도하던 스님들이 바다로 달려간다던가.
주지스님이 세월의 비바람에 단청이 다 벗겨진 대웅전[보물 제947호. 정확히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이다. 둘 다 주불로 석가모니부처를 모시지만, 대웅전은 석가모니부처의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는 데 비하여, 대웅보전은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을 모신다. 후자가 전자보다 격이 높은 셈이라 특히 대웅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을 유심히 보라고 하신다.
우와,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건물은 불타고 다시 짓고 하였지만, 창건(서기 749년) 당시부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주춧돌에 거북이와 게가 마치 살아서 기어가듯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보아서는 결코 보이지 않을 명품 조각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20세기 최고의 명언이 새삼 떠오르는 장면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보기 드물게 이 절의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바다동물이 새겨져 있을까. 혹시 다음과 같은 미황사의 창건설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신라 경덕왕 때인 서기 749년의 일이다. 어느 날 돌로 만든 배가 달마산 아래 포구에 도착했다. 배안에서 범패 소리가 들려 의조화상이 나가 보니, 금빛 옷을 입은 사람(金人)이 몰고 온 배 안에는 불경, 불상, 탱화, 검은 돌 등이 실려 있었다. 검은 돌을 배에서 내리자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나왔다. 그날 밤 의조화상이 꿈을 꾸었는데, 배를 몰고 온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는 본래 우전국(優塡國. 현재의 인도)의 왕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실 곳을 구하였소. 그런데 이곳에 이르러 달마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만불(萬佛)이 나타나므로 여기에 모시려고 하오. 검은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 모시도록 하시오”
하는 것이었다.
의조화상이 소를 앞세우고 가는데 소가 한번 땅에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더니 산골짜기에 이르러서는 쓰러져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마지막 머문 자리에 창건한 절이 바로 미황사이다. 미황사의 미(美)는 소의 울음소리가 하도 아름다워 따온 것이고, 황(黃)은 금인(金人)의 황홀한 색에서 따온 것이다.
바다로부터 불경과 불상이 전해져 절을 세웠으니, 대웅전 주춧돌에 바다동물이 새겨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을까. 더구나 이 대웅전 앞에 서면 바로 진도 앞바다가 보이니 말이다. 거북이도 게도 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리라.
의조화상은 그 검은 소를 후히 장사지내 주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있는 동네의 이름이 지금도 우분리(牛墳里)이다. 주지스님 말씀이 전에는 마을사람들이 그 소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절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산책길에 나섰다. 주지스님께서 달마산에도 둘레길을 개척하셨단다.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길이다. 호젓할 수밖에 없다.
결실의 계절답게 나무마다 갖가지 열매를 자랑한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며 걷는다. 달콤 한 것, 시큼한 것, 무미한 것... 굳이 등산을 안 하고 둘레길만 걸어도 달마산에 온 값을 하련만, 주지스님이 출타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후일을 기약하고 1시간 만에 절로 되돌아왔다.
한 것, 시큼한 것, 무미한 것... 굳이 등산을 안 하고 둘레길만 걸어도 달마산에 온 값을 하련만, 주지스님이 출타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후일을 기약하고 1시간 만에 절로 되돌아왔다.
오전 9시에 등산을 시작했다. 높이가 489m인 까닭에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1시간이 안 걸린다. 그러나 산이 높다고 해서 등산로가 평탄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오르는 길이 제법 가파르다.
잠시 숨을 돌리려고 뒤를 돌아보면 미황사의 전경 너머로 황금빛 벌판과 바다가 보인다. 노란 바다와 푸른 바다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 바다 뒤로는 진도가 어슴푸레하다.
달마산의 정상인 불선봉에는 봉수대가 있다. 이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북쪽으로 두륜산(대둔산), 동쪽으로 완도, 남쪽으로 땅끝, 서쪽으로 진도가 눈에 들어온다.
높은 산에 오르면 주위에 보이는 것 또한 산뿐인 게 우리나라 산의 정상풍경인데 이곳은 색다르다.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황금빛 벌판도 보이니 무엇을 더 바라랴. 눈이 호사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따라 남쪽 도솔봉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 능선길이 예사롭지 않다. 바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여야 하는 게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연상케 한다. 단지 절대 높이만 차이가 날 뿐이지 산객을 힘들게 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밤 미황사에서 본 달마대사의 형상을 정작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으나, 그의 법신(法身)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니 바위를 타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의 굴에서 9년간 면벽 수도 후 혜가대사에게 선법(禪法)을 전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당시 중국인들은 그가 해동(海東)으로 건너가 이곳 달마산에서 안주하였다고 생각하고 이곳을 찾아오곤 하였다고 한다.
소림사의 굴에서 9년간 면벽 수도 후 혜가대사에게 선법(禪法)을 전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당시 중국인들은 그가 해동(海東)으로 건너가 이곳 달마산에서 안주하였다고 생각하고 이곳을 찾아오곤 하였다고 한다.
미황사의 창건설화가 보여 주듯이 그 달마대사의 법신이 머물러 있었기에 우전국에서도 불경과 불상을 싣고 이곳을 찾은 것이리라. 비록 달마대사를 친견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바위가 온갖 형태의 부처상을 하고 있는 듯하여 가히 만불(萬佛)의 모습이다. 금강산에 만물상(萬物相)이 있다면 달마산에는 만불상(萬佛相)이 있다고 할까.
욕심 같아서는 달마산의 남쪽 끝 도솔암(兜率庵)이 있는 도솔봉까지 완주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험해지는 능선길에 고집을 피우다 일행 중 다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되고, 하산 후의 일정에 여유를
한겨레신문의 조현 기자가 쓴 “하늘이 감춘 땅”에도 소개된 도솔암을 꼭 보고 싶지만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마침 강진 백련사의 여연스님이 당신이랑 꼭 한번 가보자고 하시니 그 날을 기다려야겠다. 금강, 여연 두 스님과 함께 도솔천을 가려면 나도 먹물을 걸쳐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러기엔 범의(凡衣)의 무게가 아직 너무 무거운 걸 어쩌랴.
해남으로 나와 목욕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목포로 갔다. 서울행 KTX가 출발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남아 목포의 명물인 유달산에 올라갔다. 서울의 남산처럼 시민의 휴식처로 꾸며놓았고, 산에 오르면 목포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인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노래가 확성기를 타고 계속 흘러나온다. 그녀의 노래비도 세워져 있다.
흥미를 끄는 것은 유선각(儒仙閣)으로 오르는 도중에 있는 오포(午砲)였다. 이는 오정포(午正砲)의 준말이다. 1908. 4. 1. 당시의 일본통감부(統監府)는 한국과 일본과의 1시간 시차(時差)를 무시하고 한국의 오전 11시를 일본시간 정오 12시에 맞추어 정오라고 하고는 포(물론 공포탄이다)를 쏘아 이를 알리면서 생긴 이름이다. 
처음에는 포(砲)를 쏘아 정오의 신호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겼으나, 그 후 사이렌으로 정오를 알린 뒤에도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포 분다’고 하였다고 한다.
전국을 돌아다녀도 못 보던 것을 이곳에서 보니 신기했고, 그런 포가 있었다는 것조차 처음 알았다. 역시 발품을 팔면 그만큼 얻는 게 있다는 것이 여행의 묘미이다.
다만, 이 오포 또한 분명 우리의 역사의 한 구석을 차지하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아무래도 일본제국주의의 전리품인지라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 조상들은 본래 인경을 쳐서 백성에게 시각을 알리지 않았던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곳곳에서 마주치는 일제의 흔적을 어찌할거나.
그나저나 이 오포도 그렇고, 목포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 유선각도 마찬가지인데, 오포의 유래를 설명하는 안내판은 종이가 빗물에 젖어 구기고 얼룩이 져 해독이 어렵고, 유선각(儒仙閣)의 한껏 멋을 낸 행서체 현판글씨는 페인트가 벗겨져 역시 머리를 한참 굴려야 알아볼 수 있다. 목포시정을 담당하는 위정자들의 눈에는 휴식처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안 보이는 것인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전국 각지의 관광지, 등산로, 놀이터가 눈에 띄게 정비되었는데, 여기만 예외인 것인지... 한양에서 온 나그네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 가는 기차에 몸을 실으니 나른함이 몰려온다. 한 잠 자고나면 용산역이겠지. (2011. 10. 31.)
***달마산에 다녀온 후 오경미 부장판사가 그 소감을 시를 지어 노래했다. 너무나 멋진 시인지라 여기에 소개한다.
달마산 미황사에서
오경미
1
누가 저 산을 일러 달마라 했느뇨
부처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마다 부처
돌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마다 돌덩이려니
땅끝 바닷가에
천불 만불의 형상으로 우뚝 솟아올라
바라보는 이마다
그 옆 한 자리
슬그머니 내 주는
저 산 아래
하늘을 말갛게 펴고
단정히도 나앉은 대웅보전은
동안거 마치고 먼 길 나서려는 듯
삿갓 하나 쓰고 지팡이를 고쳐 쥔다
2
가람이 시원시원하여
어디 숨을 곳도 없다는
수도하던 승려들도 냅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로 달려 나가게 된다는
그렇지 그렇지,
주지스님 말씀에
대웅보전 천정에 그려진
천불 만불 부처님들도
슬그머니 마주 보고 웃으시면
늦은 시각 달빛 밟아 찾아온 손님에게
주지스님 내어 놓으시는
찻잔 가득
늦가을의 풍경소리 그윽히 담기네
3
휘엉청 달밤
30척이 넘는 괘불탱화가
대웅보전 지붕을 넘겨 불쑥 솟아 내걸리면
수백년 바람에 씻긴 단청 아래
대웅보전 초석 위로
거북이며 게들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
머리를 쫑긋
귀를 기울이는데
천리 만리 밖에서 소식을 듣는 자여
한걸음에 달려와
달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
야단법석 한바탕 벌인들 어떠리
달마산 천불 만불 사이로 잠시
사라진들 어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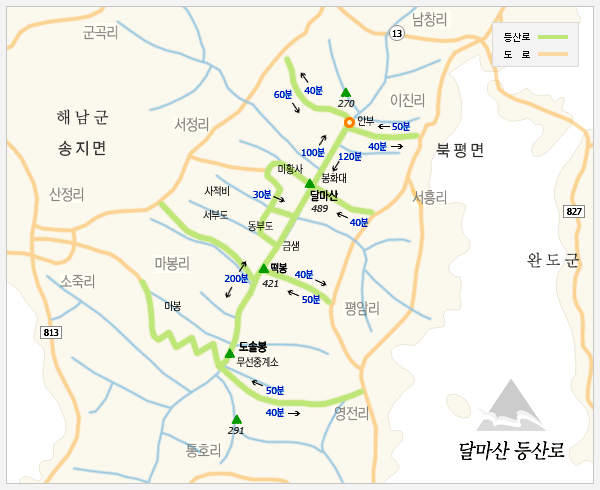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4 |
모두가 왕이런가(왕방산)
[1] | 범의거사 | 2013.02.28 | 11008 |
| 103 |
즐거움이 그 안에 있도다(대관령과 낙산사)
[3] | 범의거사 | 2013.01.29 | 11011 |
| 102 |
예단은 금물(칠장산)
[1] | 범의거사 | 2012.12.30 | 10435 |
| 101 |
명산의 출생지(방태산)
| 범의거사 | 2012.11.30 | 10185 |
| 100 |
달이 뜬다(월출산)
[6] | 범의거사 | 2012.10.29 | 9369 |
| 99 |
축지법(가리왕산)
[1] | 범의거사 | 2012.09.21 | 10505 |
| 98 |
만행( 남도 사찰길)
[1] | 범의거사 | 2012.08.17 | 11796 |
| 97 |
지리산은 보지 못했어도(사량도 지리망산)
| 범의거사 | 2012.05.27 | 10796 |
| 96 |
이거야 원...(서대산)
[1] | 범의거사 | 2012.05.01 | 8671 |
| 95 |
높음인가 기다림인가(고대산)
| 범의거사 | 2012.03.19 | 21251 |










대법관님 ! 잘 봤습니다. 낮익은 얼굴들이 많으십니다. 남도의 산하는 몇 번을가 봐도 참 새롭습니다. 저도 풍수공부차 남도 해남, 강진을 여러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은 바로 그곳 산하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글 읽었습니다. 강은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