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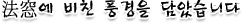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봄은 매화나무에 걸리고(春在枝頭已十分)
2014.03.02 21:02
갑오년 달력을 한 장 또 넘겼다. 올해도 벌써 1/6이 지났다.
어제가 3.1절이다. 비록 일제의 잔악한 총칼 앞에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드높은 기상을 만방에 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지 95년이 흘렀다.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기회만 되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정권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배째라’라는 식의 막가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그 정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태산이 안개에 가렸다고 해서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가 비에 젖었다고 수양버들이 되는 것이 아닐진대,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들의 행태가 장차 우리에게 또다시 커다란 우환으로 닥쳐올지도 모른다.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하여야 할 일이다.
각설하고,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雨水)가 어느새 지나고 나흘 후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내미는 경칩(驚蟄)이다. 여러 날에 걸쳐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마침내 걷힌 하늘이 모처럼 화창하다. 아마도 꽃샘추위가 한번쯤은 찾아와 어깨를 움츠리게 하겠지만, 이미 겨울은 모르는 사이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겨울이 모르는 사이에 가버리듯 봄도 부지불식간에 다가오고 있으리라. 그래서 어느 시인은 작심하고 그 봄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는 정작 집에 이미 와 있는 봄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探春(탐춘)
--- 戴益(대익) : 송나라 시인
盡日尋春不見春(진일심춘불견춘)
杖藜踏破幾重雲(장려답파기중운)
歸來適過梅花下(귀래적과매화하)
春在枝頭已十分(춘재지두이십분)
날이 다하도록 봄을 찾아 헤맸건만 끝내 봄은 보지 못한 채,
지팡이 짚고 몇 겹의 구름을 얼마나 헤치고 다녔던가.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매화나무 밑을 지나노라니,
아뿔싸, 봄이 그 나무가지 끝에 와 있은 지 이미 오래구나.

어찌 봄만 가까이에 있겠는가. 진리도, 행복도 바로 곁에 있는데, 우매한 중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곳을 헤매며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할 일이다.
갑오년 3월의 첫 일요일에 쓰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1 |
사랑하는 마음으로
| 범의거사 | 2014.12.07 | 610 |
| 210 | 혼인관계의 파탄과 부정행위(퍼온 글) [1] | 범의거사 | 2014.11.23 | 718 |
| 209 | 이적단체 활동과 민주화운동(퍼온 글) [1] | 범의거사 | 2014.10.14 | 1548 |
| 208 |
꿈을 이루는 데 시간 제한은 없어
| 범의거사 | 2014.10.09 | 882 |
| 207 |
포대화상의 미소
| 범의거사 | 2014.09.10 | 1062 |
| 206 |
도박으로 거액을 날린 것은 누구 책임?
| 범의거사 | 2014.09.06 | 873 |
| 205 |
최고법원의 길
| 범의거사 | 2014.08.23 | 1314 |
| 204 |
메추라기와 대붕
| 범의거사 | 2014.08.13 | 1445 |
| 203 | 이혼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1] | 범의거사 | 2014.07.26 | 1250 |
| 202 |
천장지제 궤자의혈(千丈之堤 潰自蟻穴)
| 범의거사 | 2014.07.24 | 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