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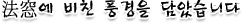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벽촌에 밤이 깊어 말없이 앉았으니--‘하석(夏夕)'의 단상
2024.09.17 22:36
올해는 여름이, 아니 더위가 정말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게 이어진다. 추석인 오늘 전남 곡성과 경남 진주가 최고 38도까지 치솟는 등 9월 중순까지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남부지방과 충청의 내륙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며 해당 지역 9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서울도 33.7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이처럼 고온이 계속되는 이유는 한반도의 대기 상층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또아리를 틀고 버티고 있는 까닭이다. 열흘 전에 백로(白露. 7일)가 지나고, 닷새 후면 추분(秋分. 22일)이니, 이젠 더위가 물러갈 법도 한데 영 요지부동이다.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를 휩쓸고 간 태풍조차 한반도는 비켜 간다.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을 가을의 시작일로 본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추석은 계절이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다. 앞으로는 한가위 명절의 이름을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추석(秋夕)이든 하석(夏夕)이든, 무더위 속에서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省墓)를 하느라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모여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나날이 커가는 손자들 모습에서 세월의 흐름을 읽는다. 서투른 솜씨로 조상님들께 잔을 올리는 큰 손자가 일견 대견하지만, 아직은 산소 주위에서 밤과 도토리를 주워 들고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아이일 뿐이다.



식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우거(寓居)가 다시 고요해졌다. 촌노(村老)의 입장에서야 아이들이 하루라도 함께 더 머무르면 좋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노욕(老慾)일 따름이다.
‘손자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다’는 우스갯소리로 허전함을 억지로 달래보지만 그렇게 쉽게 메워질 일이던가. 그러나 어쩌랴, 방하착(放下著)이라 했으니, 공연한 욕심은 빨리 내려놓을 일이다.
밤이 깊어 텅 빈 마당에서 고개를 젖히고 보름달을 찾아보지만, 달이 밝게 빛나는 곳도 많다는데 금당천의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이 잔뜩 덮여 있을 뿐이다. 하릴없이 서재로 들어와 책상머리에 앉았다.
대처(大處)와는 달리 시골의 밤은 적막함 그 자체이다. 그 속에서 책장을 넘기다 보니 마침 야보 도천(冶父 道川) 선사[중국 송나라 시대의 승려로 금강경의 내용을 선시(禪詩)로 표현하여 유명하다]의 글 한 편이 눈에 들어온다.
선사(禪師)야 금강경의 심오한 내용을 선시(禪詩)로 표현하였지만, 촌부는 그냥 표피적으로 선사의 흉내를 내 본다.
僻村夜靜坐無言(벽촌야정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적적요요본자연)
何事金風動陋屋(하사금풍동누옥)
一聲寒雁淚長天(일성한안루장천)
벽촌에 밤이 깊어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적막함이 본래 모습 그대론데
무슨 일로 가을바람은 누옥을 흔들고
찬 기러기는 먼 하늘에서 소리 내어 우는가
더위가 제아무리 기승을 부린들 결국은 물러가고 금풍(金風)에 실린 가을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소리 흥보가에 나오듯이, ‘동방의 실솔(蟋蟀) 울어 깊은 수심 자아내고, 창공의 홍안성(鴻雁聲)은 먼 데 소식 전해' 오리라.
그런데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수심이 깃들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먼 곳의 소식을 전해 올수록, 역설적으로 누옥은 적막함이야 더해 가리라. 하긴, 그게 본래 모습(本自然) 아니던가. 그래서 일찍이 조선시대의 어느 시인이 설파하지 않았던가.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내 몸을 내가 잊은 채 혹시나 해서 다시 문밖으로 나서 하늘을 보니, 오호라! 달님이 구름을 뚫고 나와 반가이 인사를 한다. 비가 온 후는 아니지만 가히 제월(霽月)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슈퍼문(Super Moon)이다.

내가 나를 잊었어도 한가위 보름달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이럴 때 하는 소리가 있다.
“반~갑다 내 달님,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내 달님!”
아무래도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은 밤이 깊어 간다.
댓글 8
-
김텃골
2024.09.17 23:56
-
우민거사
2024.09.18 08:13
아녀유, 촌부의 눈 속에 잠겨 있어유~~
-
여천
2024.09.18 00:14
식구분들과 오롯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수필이 당시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좋습니다. -
우민거사
2024.09.18 08:14
앗, 선생님, 감사합니다.
-
김텃골
2024.09.18 09:30
今夜中秋月
浮在仙眼裏 -
우민거사
2024.09.19 17:30
지는 촌부일 뿐이구, 신선은 뉘기일까유?
-
Daisy
2024.09.19 08:41
명절 잘 지내셨어요?
손자 이마의 반창고 하나가
얼마나 개구진 지 보여주네요.^^ -
우민거사
2024.09.19 17:34
ㅎㅎ 애기들은 모기 물리면 "물린디"를 바르는 대신 특수반창고를 붙인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57 |
오플레이(O’Play) ‘파우스트’
[6] | 우민거사 | 2025.04.15 | 35 |
| 356 |
약사전에 내린 서설(瑞雪)
[8] | 우민거사 | 2025.03.30 | 143 |
| 355 |
쿠오 바디스(Quo vadis)?
[5] | 우민거사 | 2025.02.15 | 134 |
| 354 |
아는 만큼 보이지 않아도 좋으니
[8] | 우민거사 | 2025.01.26 | 213 |
| 353 |
팥죽 먹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하나
[4] | 우민거사 | 2024.12.21 | 205 |
| 352 |
솔 위에 내린 눈이
[8] | 우민거사 | 2024.11.30 | 221 |
| 351 |
너는 무엇을 버릴테냐[상강(霜降의 단상]
[2] | 우민거사 | 2024.10.26 | 134 |
| 350 |
오백 년을 살고 있다
[6] | 우민거사 | 2024.10.18 | 236 |
| » |
벽촌에 밤이 깊어 말없이 앉았으니--‘하석(夏夕)'의 단상
[8] | 우민거사 | 2024.09.17 | 208 |
| 348 |
한여름 밤의 꿈
[5] | 우민거사 | 2024.08.27 | 110 |










오늘 밤 중추절 보름달
浮在爺胸裏
할아버지 가슴에 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