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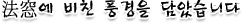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멈출 데 멈추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2026.02.01 00:24
우리나라를 찾은 어느 러시아 관광객이 “러시아보다 추운 것 같아요.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추위가 장난 아니에요”라고 했다던가.
작금에 그의 말처럼 온 나라가 얼어붙었다. 그동안 소한(小寒)보다 따뜻해 제 이름값을 못 하던 대한(大寒)을 기점으로 시작된 추위가 물러갈 줄 모른다. 그동안 일일 최저기온이 내내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어쩌다 잠깐 기온이 올랐다 해 봐야 여전히 영하 9도 안팎이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표현하는 말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적어도 올해는 사전속의 단어로 그 칠 판이다.
이처럼 한파가 오래 지속되는 원인이 역설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있다니 아이러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 주는 제트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쉽게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기 상층의 흐름을 막는 ‘블로킹(Blocking)’ 현상까지 생겨 북극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찬 공기가 계속 오도가도 못하고 정체되는 바람에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게 기상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이슬란드를 다녀온 후 가뜩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날씨 사정까지 이러하다 보니, 겨울이면 즐겨 찾던 경향 각지의 설산(雪山)은 고사하고 집 앞의 우면산조차도 외면하는 처지로 전락한 채 겨울을 통째로 보낼 판국이었다. 나흘 후면(2.4.) 벌써 입춘(立春) 아닌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인 오늘 등산화끈을 조여 맸다. '송동(送冬)'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애써 찾은 안성의 칠장산은 생각 밖으로 춥지 않았다. 물론 여러 겨울옷을 겹겹이 껴입은 탓도 있지만, 바람이 거의 안 불고 햇볕이 따사로웠던 게 큰 이유이다. 음지에는 곳곳에 잔설이 쌓여 있었지만, 완만한 능선길은 마치 봄날에 걷는 느낌이었다.
오늘 산행은 칠현산을 올랐다가 칠장산을 거쳐 칠장사로 하산하는 코스를 택하였다. 촌부가 법원산악회장을 하던 시절인 2012년 12월에도 같은 코스로 산행을 한 적이 있는데, 13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른 뒤의 재방문인지라 그동안에 바뀌고 정비된 등산로가 낯익음과 낯섦이 겹친 모습으로 다가왔다.


오늘 오른 칠현산(七賢山)과 칠장산(七長山)의 관계가 흥미롭다.
이 두 산은 옛날부터 같은 산줄기(금북정맥)로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산(서로 2.6km 떨어져 있다)이기에 칠장산과 칠현산을 합쳐 칠현산으로 불렸다. 칠현산이 높은 주봉(해발 516m)이므로 칠장산(해발 492m)은 이를테면 칠현산에 딸린 무명(無名)의 한 봉우리였던 셈이다.
칠장산 기슭에 있는 칠장사(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2023년 11월에 불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절이다)의 일주문 현판이 지금도 ‘七賢山七長寺(칠현산칠장사)’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조선시대의 고지도상으로도 칠현산만 나올 뿐 칠장산은 없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어느 권력자가 칠장산 일대를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후 칠장사 뒤쪽의 산이라 하여 칠장산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칠현산과 구별하여 칠장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들의 상징적인 공연예술장소인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까.
권력자가 특정 지명이나 건물 등의 이름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용인되어 온 일인가 보다. 중국의 10대 명차(名茶) 중 하나로 꼽히는 “벽라춘(碧螺春)”도 본래 이름이 “하살인향(何殺人香)”이었는데,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벽라춘으로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무릇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의 근저에는 바로 그 권력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행사하며 즐기려고 하는 심리가 한 구석에(아니 ‘중앙에’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자리하고 있지 않으려는지. 자기 힘으로 지명을 바꾸고, 건물 이름을 바꾸고, 차(茶) 이름을 바꾸고, 그게 역사에 길이 남게 하니 얼마나 기분 좋고 우쭐댈 일인가.
정민 교수는 인간의 삶을 붓글씨 쓰는 것에 비유하여 아래와 같이 말한다.(문화일보 2026. 1. 30.자 29면)
(전략) 늘 날렵하고 경쾌하게 순백의 지면 위를 미끄러져 가기만 하면 굴곡이 없고 마디가 지지 않아 가볍게 날리기 쉽다. 붓이 춤을 추고 먹이 튀는 활기가 좋아도 한 번씩 직수굿이 눌러주는 정지가 있어야 무게가 깃든다. 멈출 데 멈추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게가 앉고 깊이가 생긴다. 그 시간을 견뎌 다시 붓끝을 세워 작두를 탈 때 비로소 막혔던 혈도가 풀린다. 획이 날뛰지 않고 날리지 않아 날렵해진다.
권력을 잡았다고 우쭐대는 것을 마냥 비난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을 어쩌겠는가. 그러나 그럴수록 멈출 데 멈추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무게와 깊이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의 행사는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최근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어느 정관 후보자나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각종 구설에 휘말려 자천타천으로 자리를 내놓은 언필칭 선량(選良)들이 이를 말해준다.
1월의 마지막날 칠장산에서 느낀 단상이다.
댓글 4
-
Daisy
2026.02.01 06:23
-
우민거사
2026.02.01 10:28
이젠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텃골
2026.02.01 09:14
칠현산..
산 이름만 보고 죽림칠현 선비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 산 인줄 알았어여.
중국 따라쟁이 조선 선비들도 죽림에서 술과 시로 세월을 논했다고 하던데 여기 그 칠현산이 그 산인가 했죠
한여름 대밭은 독하디 독한 모기가 드글거리는데 모기약도 없던 시절 어케 대숲에서 술과 시를 곁들였는지,...
ㅎㅎㅎㅎㅎ
요른 생각만 했는디
전 왜 맨날 헛다리만 짚는지
. -
우민거사
2026.02.01 10:31
칠현산에도 산죽(조릿대)이 많인 해여~^^
근디 이곳의 칠현은 의미가 다르구먼유. 그 내용인즉,
칠현이란 지명은 고려 시대 혜소국사가 신라 때 창건된 칠장사라는 사찰에서 수도를 하던 중 일곱 도적을 제도하여 도를 깨우치게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
멈출 데 멈추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4] | 우민거사 | 2026.02.01 | 85 |
| 369 |
만리 안개 길을 막아
[4] | 우민거사 | 2025.12.20 | 96 |
| 368 |
여의강(汝矣江)에 배를 대다
[6] | 우민거사 | 2025.12.06 | 86 |
| 367 |
슬픔은 노래가 되고
[6] | 우민거사 | 2025.11.26 | 141 |
| 366 |
소설(小雪)과 억새
[6] | 우민거사 | 2025.11.22 | 143 |
| 365 |
2025년 ALB Korea Law Awards 축사
| 우민거사 | 2025.11.08 | 1533 |
| 364 |
가을비 그친 뒤에
[4] | 우민거사 | 2025.10.25 | 150 |
| 363 |
양식(糧食) 곳간과 양식(良識) 곳간
[6] | 우민거사 | 2025.09.28 | 139 |
| 362 |
백중(百中), 백로(白露), 백로(白鷺)
[6] | 우민거사 | 2025.09.07 | 189 |
| 361 |
본모습 :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6] | 우민거사 | 2025.07.19 | 225 |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