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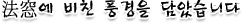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2012.08.25 17:08
어제가 처서(處暑)이고 오늘이 칠석이다.
그 덥던 날씨가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면서 시원한 바람이 소매깃을 스치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다.
아침에 우면산 등산을 하는 길이 더없이 상쾌하고,
북한산과 도봉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보였다.
처서는 말 그대로 아직 곳곳에 더위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뒤집어 보면 본격적인 더위는 물러갔고, 다만 일기예보를 하는 담당자들이 흔희 쓰는 말로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더울 수 있다는 것 아닐는지.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지고 바람이 선선하니
모기의 입이 비뚤어지고 풀도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때부터 벌초를 시작하고
기나긴 장마에 젖은 책들을 말리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리라.
그러다 보면 귀뚜라미의 등을 타고 가을이 오지 않을까.
대개는 칠석이 지나서 처서가 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윤달(윤삼월)이 있다 보니 칠석이 늦었다.
견우와 직녀에게는 그 한 달이 1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一刻이 如三秋라는데, 무려 한 달이나 늦어졌으니 얼마나 애가 탔을까.
(一刻은 15분이다)

본래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오작교에서 무사히 만나야 하기에
비가 안 오고 청명하다.
그것이 天道이다.
오늘도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소 흐리기는 하지만 적당히 맑은 날씨이다.
밤이 되거든 섬돌에 누워 詩 한 수 읊으며 두 별이 만나는 장면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瑤階夜色凉如水(요계야색양여수) : 옥 섬돌의 밤빛이 서늘하기 물 같기에
臥着牽牛織女星(와착견우직녀성) : 그 위에 누워서 견우직녀 만남을 바라보네.
[당나라 시인 杜牧(두목 : 803-853)의 시이다]
그나저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一刻이 如三秋로 기다리는 게 어디 견우직녀뿐이겠는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병원에 가면 목을 빼고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분들로 붐비고,
명절이 되면 대처로 나간 자식들이 언제나 오나 하고 늙으신 부모님들이 애를 태우시고,
지금처럼 인터넷예약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영화표를 사려고 아침부터 장사진을 쳤고,
갈 길은 멀고 바쁜데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언제나 정체가 풀리려나 조바심을 내고,
시차제 소환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법정에 가면 언제나 내 이름을 호명하나 당사자들이 기다림에 지치고...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기약이 없으니...
재판은 본래 그 본질적인 특성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미리 말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상고사건을 일정 유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어
1년에 3만여 건이나 되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몰리다 보니,
대법원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사건을 처리하여도 특정사건의 처리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一刻이 如三秋로 상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답답함을 어이할거나.
더구나 지난번처럼 대법관이 한꺼번에 오랫동안 여러 명 공석이 되는 날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시는 그런 사태가 안 오길 바랄 뿐이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80 | 1분 30초의 반전 | 범의거사 | 2013.02.26 | 13460 |
| 179 | 마음의 문을 열어 두라 | 범의거사 | 2013.01.31 | 10261 |
| 178 | 부양의무의 순위(퍼온 글) | 범의거사 | 2012.12.31 | 10659 |
| 177 | 어느 기도 | 범의거사 | 2012.12.30 | 14698 |
| 176 |
판소리의 희로애락에 빠졌다(퍼온 글)
[1] | 범의거사 | 2012.12.15 | 11430 |
| 175 |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 | 범의거사 | 2012.12.08 | 12776 |
| 174 |
조금은 부족한 듯이...
| 범의거사 | 2012.10.25 | 16097 |
| 173 |
거울 속의 모습
| 범의거사 | 2012.09.23 | 12001 |
| » |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 범의거사 | 2012.08.25 | 8979 |
| 171 | ‘대법관 빌려쓰기’ | 범의거사 | 2012.07.26 | 1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