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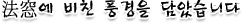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작은 소망
2010.02.16 11:14
작은 소망
1999년 12월.
20세기 마지막 달이다. 1990년 1월부터 계산하면 120번째요, 1900년 1월부터 계산하면 1,200번째요, 1000년 1월부터 계산하면 12,000번째 되는 달이다. 이 달마저 지나가면 드디어 새로운 십 년, 새로운 백 년, 새로운 천 년의 시대가 열린다. 일찍이 沃峰禪師께서는 '영겁으로 흐르는 세월을 인위적으로 쪼개놓고 달이 바뀌니, 해가 바뀌니 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고 질타하셨지만, 그래도 凡夫의 가슴에는 20세기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이 새삼스런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을 어찌하랴.
그 달력을 바라보며, 어제 진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의 지는 해를 보았던 마음과 오늘 뜨는 해를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뿐이라는 평범한 진리조차 잠시 망각의 저편으로 접어두고 싶어지는 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
누군가의 말처럼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그리움은 그리움 자체로 남겨두고, 대신 이제 곧 새 달력을 걸면서 시작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면서 소박하기 짝이 없는 작은 소망을 몇 가지 적어본다.
소망 그 하나
조용한 세상에 살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王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고 있다. 교통사고를 누가 냈느냐에 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린다고 생각하는 판이니, 그러지 않아도 밀리는 출근길에서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 놓고 멱살잡이와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멱살잡이로 해결되지 않은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에서조차 목소리 키우기 경쟁을 하고,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머리띠를 두르고 법원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심지어는 판사실을 점령하고, 가족들한테 협박전화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리라.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세상은 조용하지 않을까.
소망 그 둘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통상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 뿐인가, 농업전문가도 없고, 수산업전문가도 없고, 전자산업전문가도 없고, 군사전문가도 없고, 과학기술전문가도 없고, 문화예술전문가도 없고, 전문변호사도 없고..... 맨 없다는 타령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분야마다 야단이다.
덕분에 무슨무슨 '위원회'다 '자문기관'이다 '협의체'다 하면서 각종 기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나곤 한다. 그리고 그 기구마다 여론을 청취한다느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느니 하면서 요란한 기치를 내세우는데, 정작 그 이해관계인이자 그 분야에 관한 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나마의 전문가'의 의견은 툭하면 기득권자의 논리 아니면 기관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門外漢의 單線的 구호만이 설치는 것을 보노라면, 과연 무엇이 常識인지 헷갈린다. 권위의 파괴가 상식의 파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矯角殺牛의 다름 아닐 뿐이다.
소망 그 셋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아래는 筆者가 지난 5. 19. 사법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 낙서장(http://www.scourt.go.kr/jrti/login1.html)에 올렸던 글이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연수생의 숫자가 29기는 600명, 30기는 700명이다.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놀면 된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몫이 있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 보고 왜 노느냐고 비난할 수 없듯이, 노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보고 왜 공부하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京判이 되겠다는 헛된 명예욕이나, 엘리트검사가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공부한다"는 식의 비웃음은 피해야 한다.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가?
앞서 가는 사람의 발을 걸고,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어떻게든 하향평준화를 하려고 안달하는 평등권 만능사상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배어 있다 못해 사법연수원에서마저 설친다면 그것은 정녕 슬픈 일이다.
그렇다. 평등권 만능사상에서 벗어나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정의사회가 아닐까.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소망 그 넷
내 것을 존중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언필칭 국제화요 세계화의 세상이다 보니, 이제는 영어를 공용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자랑스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리라. 4,500만 국민이 모두 무역의 첨병에 서고, 문화사절단이 되고, 외교의 일선에 나서기라도 하는 모양이다. 자칫 두메산골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匹夫도 영어를 모르면 八不出이 될 지경이다.
우리 주위에는 외국물만 조금 먹었다 하면 내 것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외국제도를 수입하지 못하여, 모방하지 못하여 안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서구식 열린 교육을 그렇게 외치더니 정작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들은 왜 모두 꿀 먹은 벙어리일까? 영어를 진작 공용어로 쓰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 교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야 비로소 입을 열려나...
가장 韓國的인 소재로 만든 '씨받이', '물레야 물레야', '아제아제바라아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의 영화는 각종 굵직한 국제영화제에서 賞을 휩쓴 반면, 가장 西歐的인 영화 '거짓말'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受賞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중국의 장예모 감독은 헐리우드식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되었던가?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는지. (1999. 12. 1.자 법원회보)
(c) 2000, Chollian Internet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別離(연수원을 떠나며) | 범의거사 | 2010.02.16 | 14157 |
| 29 | 1754호 방지기님께- | 범의거사 | 2010.02.16 | 15808 |
| 28 | 범의거사의 유래 [1] | 범의거사 | 2010.02.16 | 40511 |
| 27 | 민일영 교수님과 양란(열린마당에서 퍼온 글) | 최관수 | 2010.02.16 | 11513 |
| 26 | 축하와 감사, 그리고 송별(열린마당에서 퍼온 글) | 김동현 | 2010.02.16 | 12972 |
| 25 | 자기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연수원 29기 사은회 치사) | 범의거사 | 2010.02.16 | 12249 |
| 24 | 교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 범의거사 | 2010.02.16 | 12718 |
| » | 작은 소망 | 범의거사 | 2010.02.16 | 13106 |
| 22 | 천년의 기둥 | 귀터도사 | 2010.02.16 | 12557 |
| 21 | 부드럽고 싶었던 남자의 辯(연수원 고별강의) | 귀터도사 | 2010.02.16 | 1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