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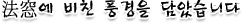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한 모금 표주박의 물(一瓢之水)
2021.05.09 13:04
비록 며칠 전(5.5.)에 입하(立夏)가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만춘(晩春)이다.
거의 전국에 경보가 내릴 정도로 느닷없이 찾아왔던 황사가 다행히 물러가 하늘이 다시 열렸다.
5월의 황사 경보는 매우 드문 일로서, 2008년 5월 이후 13년 만이다.
그 바람에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판이다.
황사 여부를 떠나 가만히 앉아서 봄을 전송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는 봄기운을 몸으로 느끼며 물이 부른 금당천변을 걸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길이 닿는 데까지 걷다가 돌아온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들이 시선을 끌고,
이팝나무의 흰색 꽃잎 위로 녹색이 나날이 짙어가는 좌우의 경치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냇가에서 노니는 백로들도 이따금 촌로(村老)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은 웃고 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花笑聲未聽(화소성미청)],
새는 울고 있지만 그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鳥啼淚難看(조제루난간)]’
고 했던가.



일찍이 퇴계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은 55세에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도산(陶山)에서 살면서 그 생활의 즐거움을 글[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幷記)]로 남겼다.
아래는 그 중 일부이다.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경치마다 흥취가 난다. 실컷 흥취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책이 가득 쌓여 있다. 책상을 마주하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잡고 이치를 궁구한다. 간간이 깨닫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중략)...
봄에 산새가 울고, 여름에 초목이 무성하며, 가을에 바람과 서리가 싸늘하고, 겨울에 눈과 달이 빛난다. 사계절 경치가 다르니 흥취도 끝이 없다. 너무 춥거나 덥거나 거센 바람이 불든지 큰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면 어느 날 어느 때나 나가지 않는 날이 없다....(중략)... 혼자서 마음속으로 얻는 즐거움이 작지 않다.
촌부야 방 안에 책이 가득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시 세끼 밥도 꼬박 챙겨 먹으니,
어찌 퇴계 선생에 비하랴마는,
금당천변에서 노니는 흥취만큼은 선생에 못지않다.
흥취야 표절한들 어떠리.
가까운 지인(知人)으로부터,
대처(大處)의 즐거움이 이보다 훨씬 더하거늘
굳이 벽촌(僻村)에서 낙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그때는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내내 마음 한구석에 미진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간밤에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지은 ‘정명촌기(正明村記)’를 읽다가 무릎을 탁 쳤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서 늙었네. 개울이 맑지 않아도 내가 어릴 적 낚시하던 곳이고, 산이 기이하지 않아도 내가 어릴 적 놀던 곳이네. 집이 좁아도 무릎을 넣을 수 있고, 밭이 척박해도 갈아먹을 수 있네. 채소뿌리와 나물국이 내 입맛에 맞고, 해진 옷과 짧은 갈옷이 내 몸에 편하니, 남에게 바랄 것이 없이 나는 만족하네. 여기에서 여생을 마치면 충분하니 달리 또 어딜 가겠는가.
이산해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인 영의정까지 지내고도 임진왜란 직후 평해로 유배를 갔을 때 그곳의 정명촌(正明村)이라는 오지에서 살고 있던 황응청(黃應淸)을 만났다.
이산해가 그에게 좁고 척박한 곳에서 사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황응천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산해는 그동안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동분서주했던(그래서 그곳에 유배까지 오게 되었던)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크게 반성하였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만족함을 모르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이 지은 시 ‘족부족(足不足)’이 정곡을 찌른다.
一瓢之水樂有餘(일표지수낙유여)
萬錢之羞憂不足(만전지수우부족)
古今至樂在知足(고금지락재지족)
天下大患在不足(천하대환재부족)
한 모금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움이 넘쳐나고
값진 진수성찬으로도 근심은 끝이 없다
고금의 지극한 즐거움은 족함을 아는 데 있고
천하의 큰 근심은 족함을 모름에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에 김오수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회자(膾炙)된다.
그 중의 백미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조선일보 2021. 5. 4.자.).
내용인즉,
법무부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나같이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막후 실력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법치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수뇌부 구성이 이렇다는 게 일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에 처해 있으면서 그 직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 자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이 혜안(慧眼)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20여 차례나 관직을 사직하거나 사양한 퇴계 선생을 생각게 한다.
'분수를 알아(知分), 분수를 지키며(守分), 분수에 만족한다(安分)'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위세를 떨치던 권력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 게 동서고금의 역사이다.
눈밭에 남긴 기러기의 발자국은 그 눈이 녹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 기러기는 날아가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게 세상 이치이다.

소동파(蘇東坡. 1037-1101)의 시를 거울삼아 욕심을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지혜를 반추해 본다.
人生到處知何似 (인생도처지하사)
應似飛鴻踏雪泥 (응사비홍답설니)
泥上偶然留指爪 (니상우연유지조)
鴻飛那復計東西 (홍비나부계동서)
인생의 모든 면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날아간 기러기가 눈과 진흙을 밟아놓은 것과 같다네
진흙 위에 어쩌다 발자국 남겼더라도
날아가고 나면 동서쪽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오
조성우 - 04 - 봄날은 간다-One Fine Spring Day (Main Theme) - 192k.mp3
댓글 4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1 |
미라가 된 염치
[2] | 우민거사 | 2021.06.27 | 618 |
| 300 |
본디 책을 읽지 않았거늘(劉項元來不讀書)
[2] | 우민거사 | 2021.05.23 | 616 |
| » |
한 모금 표주박의 물(一瓢之水)
[4] | 우민거사 | 2021.05.09 | 725 |
| 298 |
한 잔 먹세 그녀
[1] | 우민거사 | 2021.04.25 | 678 |
| 297 |
세상에는 찬 서리도 있다
| 우민거사 | 2021.04.03 | 635 |
| 296 |
조고각하(照顧脚下)
| 우민거사 | 2021.03.21 | 604 |
| 295 |
아니 벌써
| 우민거사 | 2021.03.03 | 576 |
| 294 |
과부와 고아
| 우민거사 | 2021.02.14 | 584 |
| 293 |
오두막에 바람이 스며들고(破屋凄風入)
| 우민거사 | 2021.01.09 | 663 |
| 292 |
해마다 해는 가고 끝없이 가고(年年年去無窮去)
| 우민거사 | 2020.12.27 | 652 |










사진의 백로가 우민거사님을 닮은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