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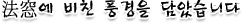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2022.10.23 12:49
상강(霜降)이다.
한 마디로 서리가 내리는 시절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침 최저기온이 10도를 오르내리는 포근한 날씨 탓인가,
서리 소식은 없고 짙은 안개만이 사위(四圍)를 감싼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금당천변 우거(寓居)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라도와 삽살이를 떠나보내고 나니 적적하다.
주말에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꼬리치고 짖으며 반기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든 자리를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정녕 회자정리(會者定離)런가.
그동안 주중에 정성껏 보살펴 주시던 6촌형수님의 연세가 80대 중반에 이르러
라도와 삽살이를 돌보는 게 힘에 부치시는 것 같아
추석을 지낸 후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
새로운 집에 가서 보핌을 받으면서 잘 적응한다는 소식을 접해
서운한 마음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
라도야,
삽살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그동안 고마웠다.


[라도와 삽살이의 마지막 모습]
비록 라도와 삽사리는 떠났지만,
그래도 우거의 안팎으로는 늦가을의 상징인 국화가 만발하여 “ 날 보러 와요~”를 외친다.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어느새 만추(晩秋)이고,
더 나아가 머지않아 곧 임인년(壬寅年)의 끝에 도달하리라.
바뀐 연도의 숫자에 이제 겨우 익숙해질 만한데 말이다.
전광석화 같은 시간의 흐름에 발맞춘 계절의 빠른 변화에 실로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흐르다 보니
마음은 여전히 청준이건만 몸은 날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탓에 일전에 불의의 사고로 어깨를 다쳤다.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다.
그런 노병구(老病軀)를 이끌고 아침 일찍 사립문 밖으로 나섰다.
녹색 벌판이 황금빛으로 바뀌었을 뿐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언제나 촌노(村老)를 반겨 주는 금당천의 뚝방길은 그야말로 가을빛이 절정이다.
하늘에는 기러기가 높이 날고,
은빛 물결의 억새가 출렁이는 물가에는 백로 한 마리가 외로이 놀고 있다.




내친 김에 율곡 선생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흉내내 시 한 수를 읊조려본다.
여강(驪江)이 어디메뇨 금당(金堂)에 추색(秋色)이 좋다
청상(淸霜)은 아직이나 황금벌이 금수(錦繡)로다
장제(長堤)를 홀로 걸으며 백로를 벗 삼노라.
이순(耳順)을 진즉에 훌쩍 넘긴 촌부야
유유자적하며 “세월아, 네월아~”해도 되지만,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
북쪽 김씨 왕조가 뿜어내는 예측 불허의 광기,
치솟는 금리와 물가,
적자의 폭이 깊어가는 국제수지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거듭 쌓여가는데,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위(僞)정자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그저 어이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은 한낱 외계인의 언어일 뿐이고,
당리당략(黨利黨略)조차도 성에 안 차
이런 이런, 이 또 무슨 망녕됨인가,
한낱 촌노 주제에 나랏님들 일에 관심을 두다니...
일찍이
“벼슬을 저마다 하면 농부 할 이 뉘 있으랴”
하지 않던가.
잔 가득 차(茶)나 따라놓고 그 향기에나 취할거나.
그래서 조선 영조 때의 가객(歌客) 이정신(李廷藎)이나 따라가 보자꾸나.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산채(山菜)가 맵다든가 박주(薄酒)가 쓰다든가
초야에 묻힌 촌부 맵고 쓴 줄 내 몰라라
Les Jours Tranquilles (조용한 날들) %2F An....mp3
(앙드레 가뇽, 조용한 날들)
댓글 6
-
태양처럼
2022.10.23 15:18
-
우민거사
2022.10.24 10:46
과문한 탓에 그런 묘비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Daisy
2022.10.23 15:36
저런, 어쩌다 어깨를 다치셨나유~~~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어유~~~ -
우민거사
2022.10.24 10:47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감사합니다.
-
김텃골
2022.10.23 18:51
남으로 창을 내겠소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갈이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ㅡ김상용ㅡ
제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시이나
이기적인 속인이다 보니
그저 읽는 걸로 만족합니다.
대법관님의 그 휴머니티
존경스럽습니다. -
우민거사
2022.10.24 10:49
어이쿠,
소생이야말로 교수님의 낭만과 풍류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21 |
소설(小雪)? 소춘(小春)?
[6] | 우민거사 | 2022.11.20 | 687 |
| » |
매아미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6] | 우민거사 | 2022.10.23 | 634 |
| 319 |
오우가(五友歌)까지는 아니어도
[4] | 우민거사 | 2022.09.25 | 617 |
| 318 |
서풍(西風)아 불어다오
[4] | 우민거사 | 2022.08.15 | 662 |
| 317 |
여름날에 쓰다(夏日卽事)
[4] | 우민거사 | 2022.07.06 | 667 |
| 316 |
바위 틈의 풀 한 포기
| 우민거사 | 2022.06.10 | 502 |
| 315 |
박주산채(薄酒山菜)를 벗삼아
[2] | 우민거사 | 2022.04.23 | 808 |
| 314 |
시절이 이러하니
[6] | 우민거사 | 2022.04.10 | 621 |
| 313 |
어찌 아니 즐거우랴
[2] | 우민거사 | 2022.03.26 | 647 |
| 312 |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2] | 우민거사 | 2022.02.28 | 661 |










그들은 분명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따라 지었을 것이다.
시진평이 말히기를 "조선은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했고, 이에 적절한 반론이 없다.
閔씨네 조상의 묘비에 有明朝鮮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묘비석은 없나요?
이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요?